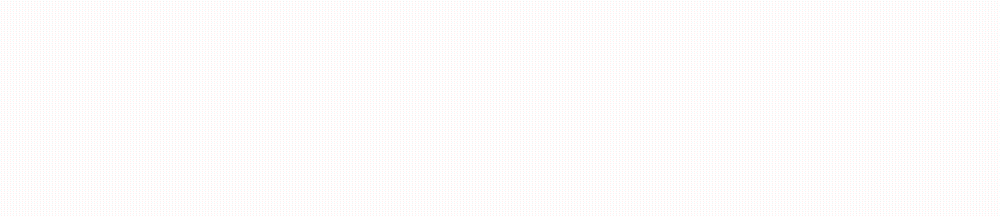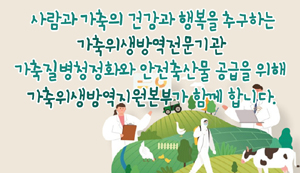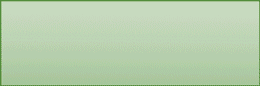잘나가는 기업’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유통업계에서 그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 중 하나는 단연 다이소다.
다이소(회장 박정부)는 1997년 천호동의 작은 매장에서 시작한 균일가 생활용품점은 이제 전국 15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다이소의 매출은 4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불과 1년 전 3조4605억원이었던 매출이 또다시 1조 가까이 뛰어올랐다. 2022년 2조9458억원에서 2023년 3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다시 한 해 만에 ‘앞자리’를 바꿨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쿠팡과 마켓컬리 같은 e커머스 업체들조차 수익성 악화와 물류비 부담에 허덕이는 사이, 다이소는 오히려 웃고 있다.
유통 시장에서 다이소는 단순한 점포 그 이상이다. 건물주들 사이에선 ‘스타벅스를 이긴 테넌트’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한때 상업 건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대표 임차인은 스타벅스였다. 직영점 운영에다 꾸준한 매출, 집객 효과까지 보장되니 관리하기도 좋고 건물 가치도 오른다는 평가였다. 그런데 최근 그 자리를 다이소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이소의 성장 방식이다. 다이소는 기본적으로 ‘가성비’에 집중한다. 가격은 낮게, 품목은 다양하게.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 다이소는 생활용품과 문구류에 이어, 최근에는 의류·화장품·건강기능식품까지 진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겐 “이런 것도 다이소에 있어?”라는 놀라움이, 기존 소매업자들에겐 “이젠 이것까지 뺏기나”라는 절망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방구다. 초등학생 필수품인 리코더 하나를 사려고 해도, 동네 문방구는 이미 사라졌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방구를 밀어낸 다이소조차 리코더는 취급하지 않는다. 결국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지가 줄어든 셈이다.
일상용품 대부분이 다이소로 집중되면서, 정작 특정 품목은 어디서도 오프라인으로 구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긴다. ‘가격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품목 소멸’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다.
약국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품이다. 기존엔 약국이나 건강식품 전문점에서 주로 판매됐지만, 이젠 다이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가격에 대한 오해다. 약국 제품이 반드시 비싼 것도 아닌데, 소비자들은 무조건 다이소가 싸다고 믿는다. 약국은 폭리를 취하는 곳으로, 다이소는 '정직한 유통자'처럼 인식되는 분위기다. 한 약사는 “다이소 제품은 소분 형태라 함량 대비 가격이 꼭 저렴하진 않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런 계산 없이 무조건 다이소를 선택한다. 기존 유통 채널이 부도덕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 바로 쿠팡이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은 단연 독주 중이다. 고용을 늘리고,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며, 지방 경제 활성화까지 외치고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기준 쿠팡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년보다 16.1% 증가한 7만8000여명. 단일 기업 기준으로 엄청난 고용 창출이다. 로켓배송, 신선식품, 멤버십 확장까지 겉으로 보기엔 소비자 편의의 총집합이다.
하지만 그 이면은 다르다. 쿠팡의 성장 속도에 맞춰 다른 기업들의 인력은 줄고, 사업은 쪼그라들고 있다.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롯데온은 1년 새 직원 수가 25.8% 줄었다. SSG닷컴과 지마켓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쿠팡이 커질수록 다른 기업은 고사하고, 시장 전체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한국은 미국처럼 시장이 크지 않다. 한 기업이 너무 커지면 다른 기업은 설 자리를 잃는다.” 쿠팡의 예는 지금 다이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만족하는 사이, 시장은 점점 한 기업 중심으로 왜곡된다. 다양성은 줄고, 경쟁은 사라지며,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제한된다.
다이소 역시 마찬가지다. 매장 수, 판매 품목, 브랜드 영향력 모두 이미 ‘대기업 수준’인데도, 여전히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규제는 피해가고 있다. 의무휴업도 없고, 업종 제한도 없다. 심지어 직영점 위주의 대형 매장 확대는 전통적인 중소상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별다른 공적 규제는 없었다. 성장의 속도에만 박수를 보내며, 그 그림자는 보지 않은 결과다.
다이소는 성공했다. 그 자체로는 박수받을 일이다. 하지만 유통업 전체를 장악할 권리까지 부여된 건 아니다. 생필품을 파는 가게가 생존하지 못하는 사회, 동네에서 리코더 하나 사기 어려운 나라가 진짜 정상일까?
쿠팡이든 다이소든, 빠른 성장 이면에는 누군가의 도태와 생태계 붕괴가 따른다. 그 기업이 잘나갈수록, 시장은 더욱 불균형해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욱 설 자리를 잃는다.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경쟁과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공정거래 당국이 침묵하는 사이, ‘1000원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1000개의 고통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