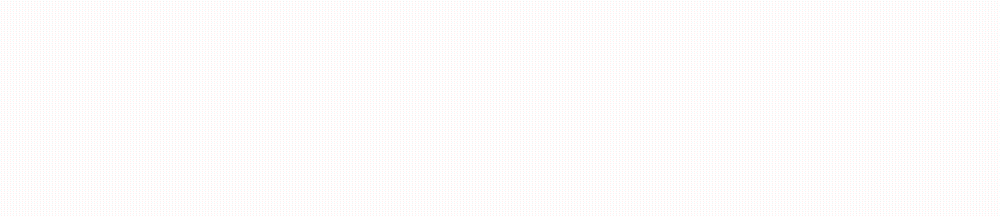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해외로 뻗어나간 KB금융이 결국 해외 투자에서 1조 5000억 원이라는 큰 손실을 보는 결과를 남겼다.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드러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부실한 리스크 관리, 형식적 내부 통제, 그리고 금융 당국의 감독 부실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KB국민은행의 위험을 외면한 무모한 도박성 해외 투자
KB국민은행은 2018년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지분 22%를 인수하며 해외 시장 확대를 본격화했다. 2020년에는 지분율을 67.6%까지 끌어올려 최대 주주가 됐다. 부코핀은행은 이미 인수 당시부터 심각한 부실 상태였고, 부실채권비율(NPL)이 6.67%에 달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상업은행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였지만, KB국민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확장’이라는 명목 아래 무리한 자금 투입을 감행하며 뻔한 적자라는 결과를 보게 된 것이다.
2020년 추가 지분 인수 당시, 2000억 원이 투입됐지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검토는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송금 당일 아침에서야 이사회에 보고되었고, 이미 결정된 사안을 요식행위로 처리하는 데 그쳤다. 투자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무리한 확장이었고, 결과는 참담했다.
부코핀은행의 부실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KB국민은행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편법적인 지원을 시도했다. 부실자산을 SPC에 매각한 뒤, 이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6400억 원 규모로 지급보증하는 방식이었다. 사실상 부실채권을 떠안고 스스로 금융 리스크를 키운 셈이다. 653억 원의 한도성 대출까지 제공하며, 이 모든 부담을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은행 자금에 전가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다. KB국민은행 스스로가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며 부실을 확대했고, 내부 감시 시스템은 이를 막지 못했다. 거대한 조직이면서도 리스크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금융 당국의 허술한 관리, 방조에 가까운 묵인의 결과... 관리소홀 책임 물어야
이번 사태의 책임이 KB국민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금융 당국도 철저한 관리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8년, 금융위원회는 은행 해외 진출에 대한 사전 보고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실한 금융사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당국의 철저한 사전 점검이 느슨해진 이유이다.
결과적으로, KB국민은행은 3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동안 금융 당국의 감시는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업무보고 주기는 반기 단위로 기간이 길었고, 핵심 건전성 지표(NPL 비율 등)조차 필수 보고 항목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문제를 인식했을 때는 이미 손실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였다. 방조했든 묵인했든, 금융 당국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역할을 스스로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 규제 완화의 역습, 이제는 해외 금융 관리 제도부터 다시 바뀌어야 한다
은행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제는 되돌아봐야 한다. 국민은행의 실패는 단순한 기업의 실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허점이 빚어낸 참사이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확장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금융 당국의 감독 권한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해외 금융사 인수 시 철저한 사전 심사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간으로 건전성 지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무능과 감독 기관의 태만이 결합하여 나타날 결과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것에 대한 경고이다. 금융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 사태를 단순한 손실로 덮어선 안 된다. 이제는 철저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책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