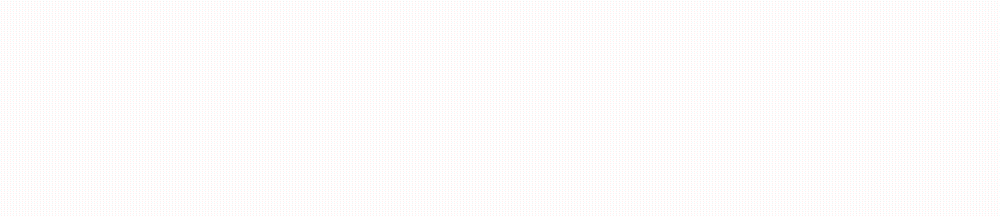언론 통합 플랫폼이자 인터넷신문사 제보팀장을 운영 중인 더에이아이미디어는 7월 2일 NZSI INDEX 기반 시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편집자주]
NZSI INDEX는 왜곡된 시장 정보에서 벗어나,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투자 기준을 제시합니다. NZSI INDEX에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 지수변경 : 1,000을 기준으로 종목 기여도 동일 반영
★ 기 준 가 : 2024. 12. 20 / 1차 개편 : 2025. 04. 01
★ 평가기준 : 20개 종목 X 5개 항목 (건전성, 안전성, 성장성, 위험도, 기대값) X 10등급 (A3 ~ D)

2025년 7월 2일, 한국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과 외국인 수급 불안이 겹치며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7% 내린 3,075.06으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 역시 0.19% 하락한 782.17을 기록했다.
이날 거래대금은 코스피 10조 8천억 원, 코스닥 7조 원 수준으로 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시가총액은 각각 2,499조 원, 399조 원으로 감소했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대형주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 하단을 지지했고, 중소형 성장주에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며 섹터별로는 엇갈린 흐름이 이어졌다.
해외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0.02% 하락한 44,484.42포인트로 마감되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94% 상승한 20,393.13포인트를 기록했다. 기술주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NZSI INDEX는 이날 1.36% 상승한 1,228.84포인트로 마감되며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수 도입 이후 누적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 시장에 편입된 6개 종목은 평균 37.51% 상승했고, 글로벌 증시에 포함된 14개 종목은 평균 16.62% 상승해 여전히 한국 시장의 초과 성과가 두드러지지만, 양 시장 간 격차는 점차 좁혀지는 양상을 보였다.
오늘은 ELS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25년 들어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열기가 다시금 달아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LS 발행액은 10조 원에 달하며 작년 동기 대비 2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파생결합증권(DLS)까지 포함하면 전체 발행액은 15조8천억 원에 이른다. 금리 하락과 해외 투자 수요의 확산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이 같은 회복세는 단순한 수요 반등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재확산시키는 신호로 읽힌다.
ELS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익을 지급하는 조건부 수익 상품이다. 대부분의 상품은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등 복수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매 6개월마다 기준지수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할 경우 +5%, +10%, +15%와 같이 점진적으로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쌓이는 구조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듯한 착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구조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지 않다. 일정 시점마다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익 실현 기회는 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 확률은 높아진다. 특히 기초자산이 한 번이라도 Knock-in 배리어(-40% 또는 -50% 하락 수준)를 하회할 경우, 만기 시 원금 손실로 전환된다. 수익은 점진적이지만 손실은 단 한 번의 급락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수형 ELS보다 개별 종목형 ELS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테슬라, 엔비디아,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Apple),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마존(Amazon), 구글(Alphabet), 메타(Meta) 등 미국 시가총액 상위 테크 기업들과 연동된 ELS가 대거 출시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반면, 단기 주가 변동성도 큰 종목들이다. 변동성이 높을수록 Knock-in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투자자에게 구조적 손실 위험을 안긴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고수익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상품을 발행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운용 수수료 구조가 있다. 증권사는 연간 1~2%의 고정 수수료를 챙기며, 상품 운용 중 발생하는 잔여 수익도 확보한다. 반면, 투자자는 조기 상환이 실패하면 아무리 이전에 수익이 쌓여 있더라도 만기 시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2023년 홍콩 H지수 사태는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가 현실화된 대표 사례다. 당시 H지수 기반의 ELS 상품이 대거 만기를 맞았고, 지수 급락으로 인해 다수 상품에서 Knock-in이 발생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원금의 절반 이상을 손실 보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상품만 더 복잡하고 고수익처럼 포장되어 다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발행된 ELS의 약 38.1%는 일반공모 형태로, 31.9%는 은행 신탁을 통해 판매됐다. 즉, 상당수 투자자들은 은행 창구에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 “원금보장 수준의 안정성”이라는 설명을 듣고 상품에 가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파생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복잡한 상품에 자산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상품은 정해진 구조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커진다’는 점진적 수익 구조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중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순간부터 수익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고, 만기까지 Knock-out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채 Knock-in만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약정 수익이 아닌 손실을 마주하게 된다. 구조적으로 손실 확률이 누적되는 상품이지만, 판매 과정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사실상 은폐되거나 축소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공학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그 이익은 대부분 금융사와 기관 투자자에게 집중된다. 개인 투자자는 복잡한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고정 수익", "예금 대체", "분산 투자" 등의 말에 현혹되어 구조적 손실에 노출된다. 지금과 같은 ELS 확산은 금융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일 뿐, 투자자를 위한 안정적 자산관리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점진적 수익’이라는 문구에 가려진 구조적 손실 가능성은 단순한 투자 리스크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설계된 착시이며, 고의적 오해의 여지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품 자체에 대한 면밀한 구조 이해와 함께, 판매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설명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가장 위험한 것은, 위험하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구조 그 자체다.
더에이아이미디어는 언론 통합 플랫폼이자 인터넷신문사인 제보팀장과 라이브뉴스를 통해 NZSI INDEX 기반 시황 보고서를 매일 발표하고 있다.